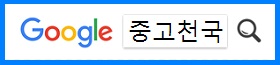야구 해설자들은 어쩌다 동네북이 되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스포츠이슈 |
"요즘 팬들이 다들 전문가잖아요. 감독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선수건, 지도자건, 구단 관계자건, 혹은 해설자들이건, 야구에 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감탄과 자조를 반쯤씩 섞어 마치 유행어처럼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실제로 그렇다. 요즘 야구팬들의 상식에 해당하는 지식과 정보는, 80~90년대의 어지간한 전문가들의 것 못지않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챙기고 전체 구단들의 대략적인 순위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면 열혈 야구팬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는 투수가 몇 승째를 기록하고 있고 타자가 홈런 몇 개를 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면 상당한 충성도를 가진 팬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선동열 승수만 알면 야구광으로 통하던 시대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관전할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한국시리즈나 올스타전 같은 특별한 경기가 아닌 한 주중 경기를 TV를 통해 중계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공중파 채널에서 중계방송을 하긴 했지만 모든 팬들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즐길 수는 없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주말 중계방송도 오후 5시 저녁 뉴스 이전까지는 마쳐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8회 말이나 9회 초쯤 화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정규방송 편성 관계로 중계방송을 마칩니다"라는 자막을 지켜보면서 탄식해야 하는 일은 대개 피할 수 없었다. 넉넉히 이긴 줄 알고 지내던 경기가 몇 년이 지나서야 극적인 막판 역전 승부의 전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일도 종종 일어났던 이유다. 창설 이후 적어도 20여 년간 야구팬들은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경기들을 TV 중계방송을 통해 결말까지 온전히 지켜본 경우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볼 수 없는 팬들은 50원이나 100원쯤의 통화 요금 지출을 감수하고라도 700 전화 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중간중간 경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밤 9시 40분쯤 TV 스포츠뉴스를 통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마저 놓친다면 다음 날 아침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스포츠면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나마 경기가 연장전에라도 돌입해서 신문 조판 마감 시간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기에 관한 내용만 빠져 있는 기사를 앞뒤로 다시 되짚어 읽으며 어리둥절해지기도 했다. 전체 내용보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